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도 뜻을 모르는 이름을 쓴다.
한자로 적지만 막상 한자 뜻과도 관련이 없다.
알고 보니 일본인 성명가의 책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역술인들의 잘못이란다.
한자 획수 따위를 헤아려 이름을 짓다니, 이 시대가 정녕 21세기인가.
이름은 한글로 짓되, 한자로 지으면 한자의 뜻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하였든 앞으로는 획수 헤아려가며 이름 짓는 미신에 벗어나기 바란다.
* 내 이름은 둘째당숙이 지어주셨다. 항렬자 載는 우리 형제와 사촌, 그리고 같은 世인 집안형제들이 같이 쓰니 정겹다. 이런 문화는 좋다. 그런데 이름은 참 마음에 안든다. 雲은 구름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 있어 지은 게 아니고 획수 계산해가며 골랐을 뿐이라는 답을 들었다. 우리 형제들은 위에서부터 亨 貞 雲 龍 求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획수만 받아 썼다는 것이다. 그래도 호를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나는 뒤늦게 TayZa란 팔리어 이름을 받아 나름대로 정겹게 쓰고 있다. 나는 '태이자 이재운' 혹은 TayZa Jaewoon Lee'로 불리기를 바란다.
-------------------
한국 작명계의 적폐 '구마사키式 성명학'
김두규의 國運風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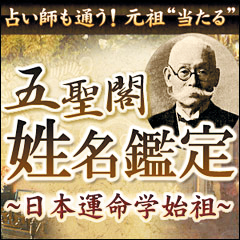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사 시절 '판표(判杓)'에서 '준표(準杓)'로 이름을 바꿨다고 밝혔다. 앞의 '죽자'씨와 달리 법원장 '백'으로 쉽게 개명을 했다. '판표'와 '준표' 사이에 의미론적 차이가 있을까?
이름에 관한 한 필자도 만족하지 않는다. 한자로 '枓圭'로 표기하는데, 별 뜻이 없다. 유학 시절 중국학 교수가 뜻을 물었을 때 당황할 정도였다. 또 발음이 어렵다. '두규'라고 하면, 받아 적는 사람들은 '득유' '득규' 등으로 표기한다. 그렇다고 개명을 생각해본 적은 없다. 이름은 부모 혹은 조부모(외조부모)가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 짓는 경우도 있지만, 학식 있는 지인이나 사주·작명가를 통해서 짓는 경우가 많다. 이름은 자식에게 주는 부모의 유일한 특권이다. 필자가 개명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특권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다.
왜 이름을 바꾸는가? '일이 잘 안 풀려서'라는 이유가 많다. 홍 대표뿐 아니라 많은 예능인이 그렇게 말한다. 그 역사는 오래 됐다. 양명학(陽明學)의 창시자 왕수인(王守仁·1472~1528)의 이야기이다. 할머니가 그의 태몽을 꾸었다. 신선이 구름 속에서 아이를 내려 보내는 꿈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운(雲)'이라 지었다. 그런데 아이가 다섯 살이 되도록 말을 못했다. 수인(守仁)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 개명을 하자마자 말문이 트였다. 왕수인처럼만 된다면 왜 개명을 마다하겠는가? 문제는 현재 작명법이 시대착오적이며 중국과 일본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명에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성씨마다 고집하는 돌림자(항렬)를 따른다. 홍 대표의 경우 가운데 글자만 '판'에서 '준'으로 바꾸고 '표(杓)'를 그대로 둔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돌림자는 오행의 상생 순서(木→火→土…), 십간 순서(甲→乙→丙…) 등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친족 간의 위계와 단합을 강조하던 집단주의 유습이다. 둘째, 태어난 아이의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을 넣어 이름을 짓는 경우이다. 예컨대 오행상 불[火]이 없으면 한자에 火 부수(部首)가 들어간 글자를 삽입한다. 셋째, 한자의 획수를 따져서 이름을 짓는 방법이다.
특히 세 번째 것은 일제시대, 특히 창씨개명 즈음 수용된 일본식 작명이다. 구마사키 겐오(熊崎健翁·1881~1961)라는 신문기자가 운명학을 연구해 30대 나이에 일약 성명학 대가가 되었다. 그는 "성명은 인간 개개인의 특수 표기 부호이자 운명의 숙소"라고 전제하고 성명에 쓰이는 문자(文字)와 수리(数理)를 연구해 '구마사키식 성명학(熊崎式姓名學)'을 창시한다. 이어서 1928년 '고세이가쿠(五聖閣)'라는 성명학 감정 및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구마사키식 성명학'은 한국의 사주·작명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명법이다. '적폐'다.
항렬·사주·한자획수라는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 정작 이름에 뜻(내용)이 들어가지 못한다. '내용 없는 형식'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가! 이름은 부르기 쉽고 뜻이 아름다워야 한다.
개명을 하지 않고도 좋은 이름을 쓸 수가 있다. 호·필명·예명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아름다운 습속이다. 필자도 심재(心齋)라는 호가 있다. 누군가 '심재!'로 불러주면 왠지 기분이 좋다.
'이재운 작품 > 태이자 우리말 사전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 기자들, 영혼은 어디 저당 잡혔나? (0) | 2018.02.24 |
|---|---|
| 인간 의식은 언어로 길을 삼아 나아간다 / 반나절 (0) | 2018.02.12 |
| 우리는 조금 더 분별력이 있으면 안될까? (0) | 2017.12.06 |
| 한문 모르는 기자는 한자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0) | 2017.11.25 |
| 이러고도 한글 우수성만 자랑하는가 (0) | 2017.11.18 |



